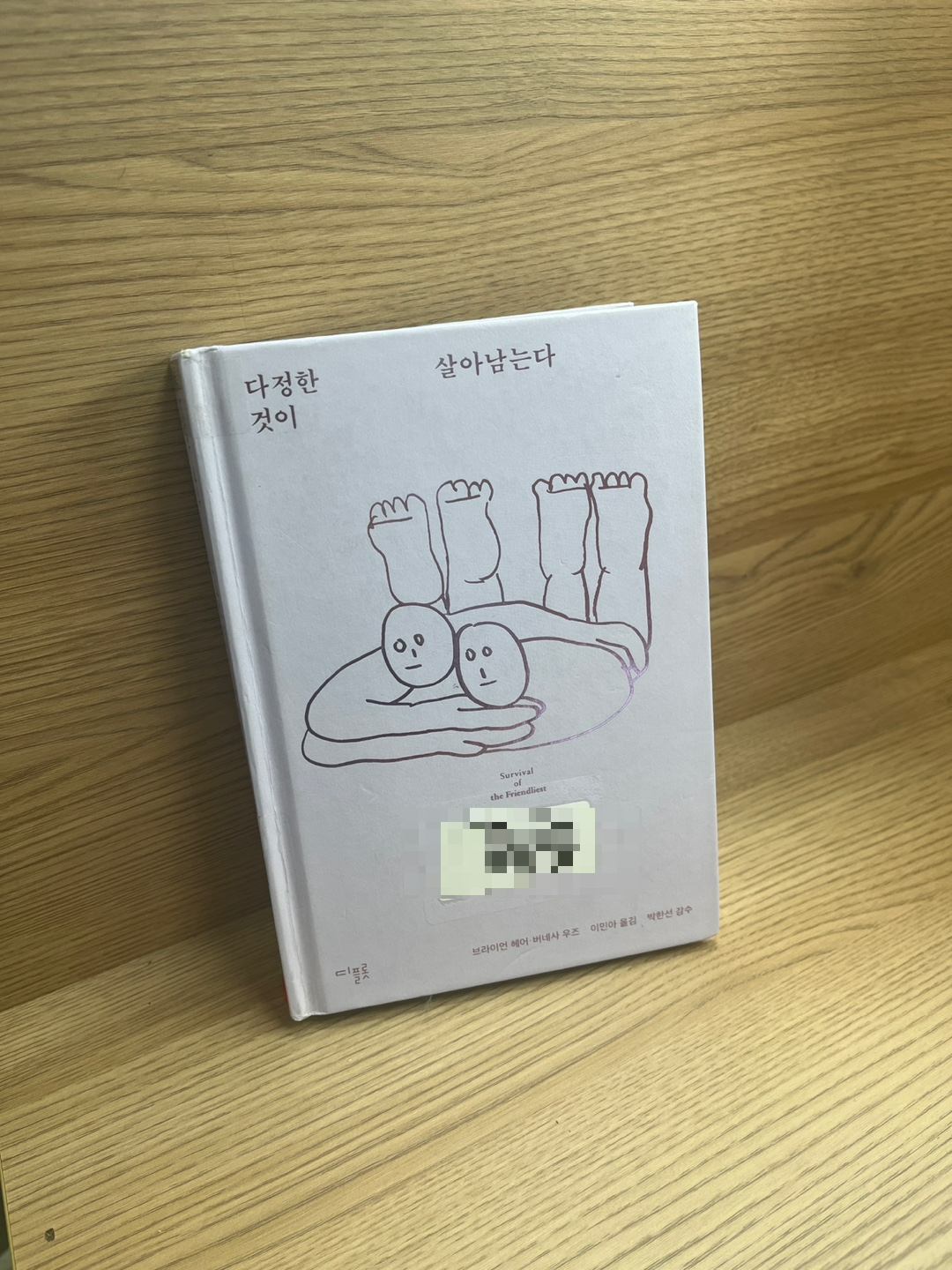
- 진화론에 대한 나의 흥미는 지난 글에서 그치지 않았다. 지난 글이 자연에서 상대적으로 척박한 환경의 생물이 빠르게 번식하고 빠르게 생을 마감하는 방식으로 살아남는 것을 짚었다면 이번 책은 자연 속에서 다른 이에게 더 친화적으로 대한 종이 오래 살아남을 수 있었다는 이론을 다루고 있는 책이다.
- 먼저 굉장히 어렵다. 책 속에서 수많은 과학적 이론이 바탕으로 나오기도 하고, 많은 실험을 진행한 내용이 근거로 제시되기 때문에 아마 작년에 읽은 <소유냐 존재냐> 만큼 손꼽히는 어려운 책이라고 생각한다.
- 이렇게 어려운 책을 읽고 글을 쓰기 위해서는 책을 읽는 도중도중 흥미로운 부분에 대한 정리가 필수적이고 오늘은 그 부분만 간략하게 정리해보도록 하겠다.
- 호모 사피엔스는 미숙하지만 자애로웠다.
- 이 책에서 먼저 흥미롭게 봐야할 부분 중 하나는 우리의 옛 과거이다. 호모 사피엔스는 당시 경쟁자였던 네안데르탈인보다 머리가 같거나 작았다. 네안데르탈인은 굉장히 지능적이고 예술적이었으며 우리가 아는 '적자생존'의 법칙에서는 조금 더 승자의 추로 기우는 종이었다.
- 그러나 호모 사피엔스에게는 네안데르탈인에게 없는 무엇이 있었다. 바로 협력적 의사소통이다. 한번도 본 적 없는 누군가와 하나의 공동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함께 일하는 능력이 있었던 것이다.
- 저자는 이 능력을 '자기가축화' 라는 용어를 사용해 표현한다. 자기가축화는 야생종이 사람에게 길드는 과정에서 외모나 행동에 변화가 일어나는 현상인데, 인간에게도 사회화 과정에서 공격성 같은 동물적 본성이 억제되고 친화력이 높아지는 방향으로 진화했다는 것이다.
- 결국 이 협력적 의사소통 곧 친화력은 타인에게 감수성을 가지게 해주었고, 공동의 목표를 위해 힘쓰게 해주었으며 그러한 목표에 반하는, 심지어 잠재적으로 위협이 될 수 있는 다른 집단은 아예 인간으로 여기지 않을 정도의 무자비성까지 선사시키게 된다.
- 신생아와 강아지의 공통점
- 지나가는 사람을 아무나 붙잡고 무작위 위치를 검지손가락으로 가르켜 보자. 모든 사람들은 우리가 가르킨 그곳에 무언가 주위를 끌만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고 시선을 돌릴 것이다. 우리에겐 당연해 보이는 이 과정은 우리를 다른 종들과 차원이 다른 종으로 진화시키는데 일조했다.
- 신생아 아기는 생후 9개월, 그러니까 타인에게 공감하거나 거짓된 행동을 해 이득을 얻거나 첫 단어를 입으로 내뱉기 전부터 손끝이 가리키는 배경을 본다. 그러나 대다수의 종은, 특히나 우리와 굉장히 흡사할 것으로 여겨졌던 침팬치는 우리가 어딘가를 가리키면 그 뜻을 모른채 우리의 손 끝에만 시선이 머문다.
- 우리는 본능적으로 타인과 신체적인 상호작용을 할 수 있게끔 진화하였다. 우리가 수면욕, 식욕, 배설욕의 기본적인 욕구를 제외한다면 감정을 배우기 전부터 타인과 의사소통을 하는 법부터 습득하는 것이다.
- 그러한 능력을 갖춘 하나의 종이 더 있었으니, 바로 개이다. 이 책은 실험을 통해 앞에서 언급했던 자기가축화가 된 개들은 사람이 전분을 섭취할 수 있도록 진화를 도운 유전자가 개에도 있어 사람이 채집한 양식을 거뜬히 소화할 수 있게 됐고, 아프리카 지역 사람들에게 있는 말라리아의 항체가 그 일대 가정의 강아지들에게도 발견되었으며, 무엇보다 사람 고유의 전유물일 줄 알았던 수신호 의사소통이 개에게도 숙지된 상태로 진화했다는 것이 밝혀졌다.
- 우리의 협력적 의사소통의 기초단계이자 인간성의 원천
- 누군가의 인간성을 없애는 가장 빠른 방법이 뭔지 아는가? 바로 눈을 까맣게 칠해버리는 것이다. 우리의 눈은 다른 동물 특히나 침팬치의 눈과 달리 흰색 공막 위 홍채가 있는 모습이다. 침팬치의 눈은 공막과 홍채가 뒤섞여 보통은 짙은 빛을 낸다.
- 이런 눈의 큰 특징은 어디를 보는지 쉽게 알아차릴 수 있다는 데에 있다. 우리는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눈맞춤에 의존하여 살아간다.
-아기의 눈빛은 부모에게 옥시토신을 분비시키는데, 이 물질은 우리에게 사랑이 샘솟는 느낌을 준다. 아기 역시 부모의 눈맞춤으로 비슷한 호르몬이 분비되는데, 이 때문에 부모와 자식은 서로를 더 오래 마주보면서 사랑을 느끼는 의사소통을 한다.
- 만약 협력적 의사소통의 가장 기초 단계인 눈맞춤이 없었다면( 우리의 동공이 정확히 어디를 보는지 알 수 없었다면 ) 부모는 우리가 소리내어 웃거나 미소지을 줄 알기까지의 석 달을 버티지 못했을 수도 있고, 아기는 부모의 눈빛 방향으로 부모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.
- 이렇게 진화에 대해 서술한 책들은 우리가 여기의 위치에 있기까지 어떠한 과정이 있었는지에 대한 큰 영감을 준다. 어렵지만 한번쯤 읽어볼 가치가 충분했던 책이 아닐까 싶다.